거미의 땅
서울독립영화제2013 (제39회)
특별초청(장편)
김동령,박경태 | 2013 | Documentary | Color | HD |150min
SYNOPSIS
철거를 앞둔 채 침묵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기지촌에는 몸에 각인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 여인이 있다. 30년간 선유리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온 ‘바비엄마’, 의정부 뺏벌의 쇠락한 골목에서 폐휴지를 줍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박인순, 그리고 흑인계 혼혈인 안성자의 분절된 기억을 따라, 망각된 기지촌의 공간 속에서 ‘의무의 여행’을 시작한다.
DIRECTING INTENTION
미군 기지촌을 다뤘던 일련의 전 작품들에서 인물의 삶에 집중하는 비교적 전통적(?) 문법을 따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난 뒤, 우리의 관심은 쇠락한 기지촌의 공간 그 자체로 이동했다. 구체적으로는 곧 철거 예정이던 경기 북부 기지촌에 관한 사진책을 만들기 위해 기지촌으로 의심되는 작은 마을들을 전부 탐사하고 아카이브적인 작업을 할 때였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무려 서울의 9배이고 남한 전체 면적의 5%에 해당한다. 그중 휴전선과 가까운 오래된 마을 중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 기지촌이 아닌 곳은 없었다. 주민들의 불편한 태도와 경계심 너머로 그들이 신기루처럼 기억하던 기지촌의 모습이 쇠락한 공간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상 이상으로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사실보다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적 실재였던 기지촌이 이렇게까지 망각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따라서 우리가 답사 중에 골목길과 빈 폐허를 거닐며 배회하는 유령을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공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공간은 결국 인간의 기억이 그 속을 채운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혼혈인들의 죽음(2009년 <있다>의 주인공 박명수와 2007년 살해된 김종철의 죽음)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엄마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 고향을 모르거나 고향 자체가 저주였던 이들이 죽은 후에 유령이 되어 마을을 떠돈다는 애초의 계획은 세 명의 인물로 나뉘어 재현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던 선유리의 박묘연, 의정부에 사는 <나와 부엉이>의 주인공이었던 박인순, 그리고 혼혈인 안성자와 왕래하며 영화적인 가능성을 계속 실험해 보았다. 이 영화는 단순한 과거의 재연에 대항하고 일상만을 따라가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했다. 어디로 흘러갈지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우리는 구술 생애사를 토대로 인물들과 함께 장면들을 재창조했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재촬영하면서 이야기가 서서히 구성되었다. 세 명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윤리적 재현 방법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공간은 그들의 일상과 기억 속에서 심리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다. <거미의 땅>은 기지촌을 겪어 낸 이 세 여성들뿐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목도한 공간에 대한 오마주이다.
FESTIVAL & AWARDS
2012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2013 제1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3 제13회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3 제17회 체코 이흘라바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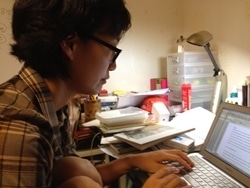
김동령
1999 모녀참새의 하루
2002 기억과 망각사이
2003 날개
2004 로스트 앤 파운드
200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08 아메리칸 앨리

박경태
2002 나와 부엉이
2005 있다
2009 사당동 더하기 22
STAFF
연출 김동령, 박경태
제작 안보영
음악 투명
녹음 문준영
조연출 장지남
출연 박묘연, 박인순, 안성자
PROGRAM NOTE
김동령, 박경태 감독의 <거미의 땅>은 미군 기지촌을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기지촌이라는 공간의 지정학적 위상과 그곳에 새겨진 사적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영화는 미군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전직 기지촌 여성 3인을 따라간다. 26번의 임신 중절과 자궁 절제 수술까지 한 분식집 주인 박묘연, 폐휴지를 주우며 그림 그리기를 통해 트라우마를 지우려는 박인순, 친모에 의해 고아원에 보내진 흑인계 혼혈인 안성자,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이들의 삶은 역동적인 회고의 경로를 따라 하나의 태피스트리로 엮인다. 미군과 지역 여성들의 비극적 만남 뒤에 웅크린 질곡의 연대기라는 제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거미의 땅>의 화술은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박묘연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관습적인 다큐멘터리 양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니와 세라의 이야기’라는 액자 이야기가 가미되는 안성자의 스토리에 이르면 시네마베리테적인 기록을 초월한 시적인 탐구로 나아간다. 세 여인의 기구한 삶은 인터뷰와 내레이션, 주술적 주문, 편지, 판타지 등 다기한 형식으로 조명된다. 박묘연으로부터 안성자에 이르는 이동의 경로를 따라 또는 육체와 정신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을 따라 <거미의 땅>은 그들이 감당했던 박해의 순환성을 은근하게 암시한다. <거미의 땅>을 진전된 다큐멘터리의 미학을 보여 주는 역작으로 만드는 것은 세 인물의 디테일 안에서 역사와 공간의 아이러니를 응시하는 두 감독의 시선이다. 애달픈 진실과 시적인 성찰이 교차하는 작품으로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장병원/영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