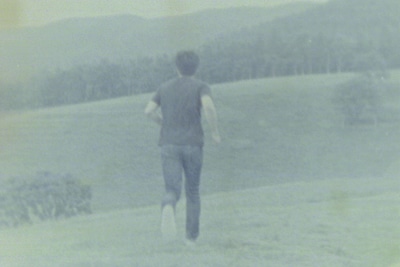Three Stories about Depth
2012
Short 5
CHOI Seung Chul | 2012 | Experimental | Color | HD | 8min 46sec
SYNOPSIS
The first story deals with the dictionary meaning of depth ― as “from outside to inside” and “further away.” The second story expresses the emotional meanings of depth such as cravings and desires. The third story goes through an incomprehensible repetition of words just like being sandwiched between two mirrors, and inquires the end of baffling situations and the sunlight, finally.
DIRECTING INTENTION
The title is self-explanatory. This film started with the simple purpose of finding out how to shoot a “deep” film. It seems as though when the audience lauds a piece of art with the words “magnificence,” “splendor,” and so on, the word “depth” also seems to stroll right behind. Well then, who is the first to describe such a film as deep? And are we to naturally understand and identify with that feeling or does that depth become necessary? This film is a collection of three of my short thoughts about depth.
FESTIVAL & AWARDS
Premiere
DIRECTOR

CHOI Seung Chul
STAFF
Director CHOI Seung Chul
Producer HAN Jae Hyun
Screenwriter CHOI Seung Chul
Cinematography KO Eun Hae
Editor CHOI Seung Chul
Lighting KO Eun Hae
Cast KIM Hee Jung, LEE Yeon, YOON Sang Bum, YOON Hee Soo, HAN Jae Hyun
PROGRAM NOTE
이 영화는 세 개의 숏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세 숏은 내용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 독립적인 단상들로, 모두가 제목에 충실하게 ‘강요되는 깊이’에 대한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옮겨 놓은 것이다. 영화가 선택한 첫 번째 단상과 세 번째 단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 단상은 한 인물이 화면의 전경에서 출발해서 후경으로 달려가 기어이 풍경의 너머로 사라지기까지를 촬영한 고정 앵글의 롱테이크 숏이다. 영화/카메라의 기계적 속성에서 유발되는 시각적 깊이, 즉 심도를 보여 주려는 의도다. 그런데 이 숏은 피사체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일정 시간 지속된다. 우리는 피사체의 운동이미지가 만들어 낸 그 소실점의 끝에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그 시간의 지속 속에서 강요받는다. 세 번째 단상은 두 명의 인물이 마주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소리를 서로 논쟁적으로 발성하는 모습을 잡은 이인 숏이다. 이번에 카메라는 고정이 아니라 서서히 줌-인하여 마주 앉은 두 사람 너머 풍경 안으로 화각을 좁혀 간다. 입장, 관점, 관념으로서의 깊이와 일방적 주장으로서의 강요. 그것의 부조리적인 강조가 이 숏의 콘셉트다. 사실 이 두 가지 단상만을 놓고 본다면, 영화는 다분히 교과서적이고 일차원적이어서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포인트는 두 번째 단상이 보여 주는 외설적인 상상이다. 오럴 섹스를 하는 여자의 모습을 남성의 시점 숏처럼 직부감으로 찍은 두 번째 단상은 그 자체로 당혹스러운데, 어떤 점에서는 앞뒤 단상이 갖는 상식적이고 고지식한 방식과 대조되는 발상 때문에 유머러스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첫 번째 단상과 세 번째 단상은 이 두 번째 단상이 갖는 센세이셔널한 느낌을 상쇄시키고 다른 측면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이자 배치인 셈이다. 이 영화의 콘셉트에 대해 깊이 있게, 혹은 그 의도나 방식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다분히 논쟁적이 되거나 불쾌해질 수 있겠지만, 작가는 ‘깊이에의 강요’라는 무겁고 엄숙한 테마에 대한 외설적인 농담 혹은 장난기 가득한 항변 정도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다.
장훈/서울독립영화제2012 예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