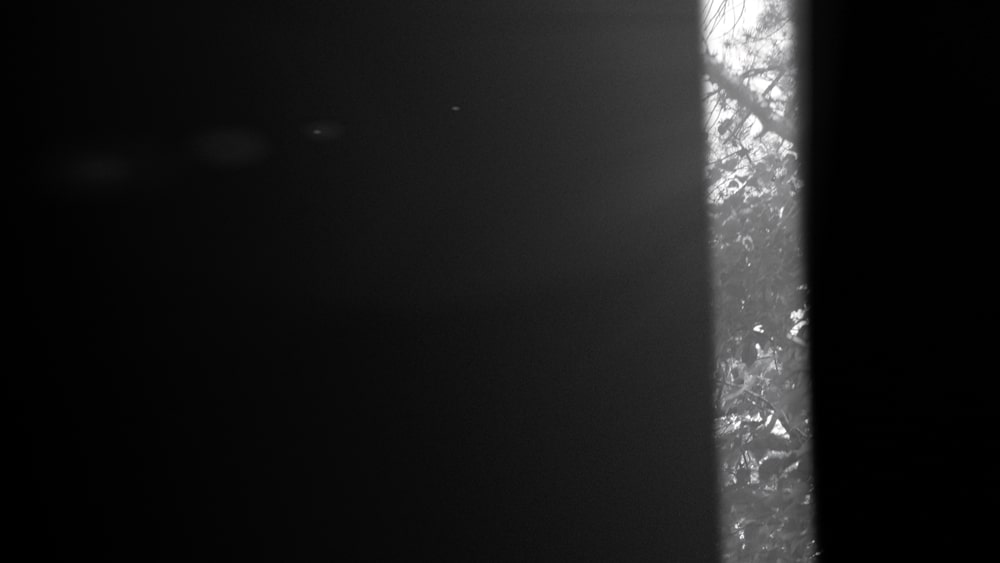형제봉 가는 길
서울독립영화제2018 (제44회)
통일기획
임흥순 | 2018 | Experimental | Color+W&B | DCP | 26min (E)
SYNOPSIS
한 남성이 나무관을 메고 북한산 산행을 시작한다.
DIRECTING INTENTION
개성공단은 북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에 위치한 공업지구이다. 그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며 평화의 공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런 공단 폐쇄와 철수는 남북관계 뿐만아니라 남북한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북측 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소원을 담아 연출자, 북한이주여성 아코디언 연주자 이향, 게이코러스 합창단 지보이스(G_Voive)와 협업을 시도했다.
이 작품은 ‘문화역서울 284’ 전시공간에 맞춰 2채널 비디오, 12채널 사운드로 제작된 ‘장소특정적 영상 설치작품’으로, 이번 상영을 위해 특별히 단채널 영상으로 재편집되었다.
DIRECTOR

임흥순
2012 <비념>
2014 <위로공단>
2016 <려행>
STAFF
연출 임흥순
프로듀서 김민경
제작 반달
각본 임흥순
촬영 지윤정, 임흥순
편집 이학민(127Company), 임흥순
조명 박정우
음악 정나래
믹싱 김근채, 장준호(펑크타이어 스튜디오)
미술 한주예슬
출연 임흥순, 지보이스, 이향
PROGRAM NOTE
추상의 언어로 구체의 감정을. 임흥순 감독의 필모그라피를 통해 관철되는 작품세계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를 가장 강렬하게 인식했던 첫 작품은 2012년 소개된 <비념>이었다. 제주 4.3 항쟁, 통한의 역사가 스치고 지나간 상흔들을 미적 추상과 역사의 산증인들을 통해 증언하게 하였던 이 작품은 그간의 독립 다큐멘터리가 형상화했던 현대사의 비극과는 다소 차별적이었다. 그는 이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은사자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을 통해, 여성과 노동, 착취와 폭력, 기억과 증언의 서정시를 구성한다. 그리고 쉼 없이 이어진 그의 작품세계는 다시금 역사 속의 개인, 무엇보다도 끝내 외면하거나 지워낼 수 없는 분단의 상처와 흔적들을 형상화하기 시작한다. 분단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했던 첫 작품은 2015년에 만들어진 단편 <북한산>이었다. 탈북 가수 김복주가 한복을 차려입고 어스름 새벽에 출발해 북한산을 오르는
여정을 추적한 이 작품에서 카메라는 묵묵히 그녀의 뒤에 머물러 있다. 영화는 그녀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대신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녀는 가뿐 숨을 내쉬며 산을 오르는 내내 분단으로 상처 입은 자신의 개인사를 진술한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는 흡사 유령이거나 멸시와 외면의 대상이었다. 보수 미디어가 전하는 그들의 언어는 왜곡되고 과장되었으며, 진짜 언어는 들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산’으로 향하는 그녀의 언어와 발걸음은 평범하고 구체적인 개인이 진짜 체험하고 간직하고 있는 기억과 감정을 통해 분단을 환기하는 언어가 된다.이 영화는 2016년 완성된 장편영화 <려행>을 통해 보다 여럿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제의적 퍼포먼스를 통해 완성되고 그리고 올해 완성된 새로운 작품 <형제봉 가는 길>로 연결된다. 문화역서울에서 2채널 영상과 12채널 사운드로 먼저 전시되었던 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분할화면 이미지로 재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명백히 <북한산>의 이면화 혹은 세 번째 버전처럼 보인다. 화면 한쪽에선 임흥순 감독이 직접 관을 메고 북한산 형제봉에 오르는 과정이 기록된다. 그리고 다른 화면에서는 폐쇄된 개성공단협력업체의 좌절과 절망, 올해 극적으로 전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뉴스 사운드, 합창단 G보이스가 부르는 ‘그날이 오면’이 울려퍼진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착화되면서, 우리에게 통일은 되려 낯설고 외면하고픈 관념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역사이고 실패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어둡고 잔혹했던 상흔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기록하는 임훈순 감독의 시선은 세 편의 연작을 통해 분단과 통일에 관한 흥미로운 은유이자 공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북한산’에 가 닿는다. 높은 곳에 이를 때 더 멀리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정지연 / 영화평론가